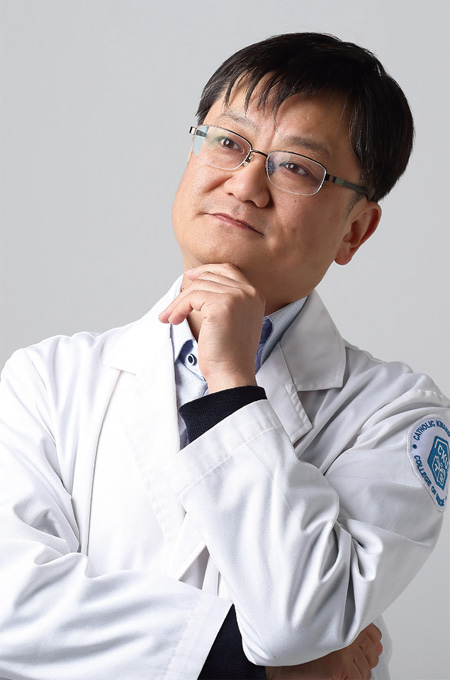
박웅섭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는 강원도 건강 마을의 기적을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다. 6년 전부터 건강플러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조직하고, 각 마을에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들을 교육하고, 각 위원회의 사업을 일일이 챙기는 그 모든 일을 쉼 없이 해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연구논문을 쓰기 위한 것도 아니다. 논문을 위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자연스레 관심이 멀어지는 교수가 대다수이지만 그는 반대다. 건강플러스 마을사업 관련,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일 만큼 쌓였지만 논문엔 통 관심이 없다. “언제 쓰실 건가”라는 질문에 “써야죠”라며 그저 웃는다.
산파역 입장에서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의 승승장구를 보면 어떨까. 그는 “건강지표가 실제로 변해가는 걸 보면 나도 놀랍다”며 “하면 할수록 미치게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놓는 건강플러스 사업의 성공 비결은 이렇다.
“주민 속으로 들어가 주민의 언어로 주민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일면 간단하다. 하지만 이 간단명료한 비결을 깨우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행착오도 많았다. 국내외 사례들을 쌓아놓고 공부하고, 성공한 현장의 노하우를 배워오기 위해 숱한 답사를 다녔다. ‘노숙자 마을의 기적’으로 불리는 동자동협동조합은 물론 경기도 안산 의료생협 등의 성공 메커니즘을 몸으로 배워왔다.
만나는 데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 300명을 일대일로 만나야 합니다. 건강플러스 사업을 홍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300명 중 290명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중 10명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 10명을 찾아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데에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섣불리 간섭했다간 설익은 밥이 돼 버리고 만다. 그 역시 시행착오를 거쳤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 직접 들어가 건강위원회를 이끈 결과 실패로 돌아갔다. “관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일을 보건소가 도와주도록 해야지, 그 반대가 되면 성공할 수 없어요.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박웅섭 교수에게는 박사학위가 세 개나 있다. 보건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공공보건사업’으로 귀결되는 학문들이다. 건강플러스 사업은 세 영역이 절묘하게 녹아들어 있다. “잘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나”란 질문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내 신념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무한경쟁 속에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일 뿐, 이타적 유전자를 믿었습니다.”
박웅섭 교수는 한때 혁명을 꿈꾸었다. 그가 말하는 혁명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공평하고 형평성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 그의 손길로 건강지표가 바뀌고 있으니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이룬 셈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상식적인 발언과 구체적인 발언을 오갔다. 건강위원회 성공 노하우는 아주 구체적이었지만, 성공을 위한 신념은 아주 상식적이었다. 그는 “내가 왜 예방의학과를 택했는지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임상을 했을 겁니다. 예방의학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죠. 한 사람을 고치느냐, 가족과 사회를 고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사로서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