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말마다 광장이 붐빈다.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든다. 실로 엄청난 ‘군중’이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고 거리를 깨끗이 청소까지 한다. 언론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칭송한다.
과연 집회의 질서정연함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일까. 또는 군중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하나일까. 이러한 상념이 머릿속을 맴돌 때 한번 펼쳐 보고 싶은 고전이 있다. 바로 귀스타브 르봉(Gustave Le Bon·1841~1931)의 ‘군중심리학’(Psychologie des foules·1895)이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본격적으로 군중의 심리를 분석한 선구적인 저술이다.
르봉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으나, 정작 의사로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유럽·아시아·북부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저술활동에 매달렸다. 그는 스스로 박사라고 칭했으나, 학위취득과정이 다소 불투명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같은 제도권에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이런 약점이 오히려 그의 사유를 자유분방하게 넓힌 요인이 되었다.
그는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덕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그의 관심은 의학·인류학·고고학 등을 거쳐, 1890년대에는 사회학·심리학·물리학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그의 지적 편력은 다채로웠다. 바로 이 시기에 저술된 대표작이 ‘군중심리학’이다. 여기서 그는 직관적 통찰력을 발휘해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의 특징적 양상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당시 프랑스는 혁명과 왕정복고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프로이센·프랑스전쟁(보불전쟁)과 파리코뮌이라는 격랑에 휘말렸다. 특히 급진적 좌익정권인 파리코뮌(1871)은 불과 두 달여 만에 무너졌지만, 그 사이 군중에 의해 행해진 폭동, 폭력, 즉결처분, 징발, 보복 등은 시민계급을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시대적 변화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이때 르봉은 ‘군중’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임을 간파했다. 여기서 군중이란 어떤 감정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심리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는 이를 ‘심리적’ 군중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단순한 운집 자체는 무의미하다. 반면 고립되어 있더라도 격렬한 심리적 결합이 있다면 그것은 곧 군중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개인이 군중에 참여하게 되면 심리적 변환을 겪는다. 무엇보다 개인은 군중 속에서 익명 상태가 되어, 홀로 있을 때 억압되었던 본능에서 해방된다. 따라서 그는 개성을 상실한 채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야만인이 되고 만다. 그리하여 자발성, 폭력성, 영웅주의, 열광 등에 휩싸인다. 그것은 고립된 개인에게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군중의 감정은 단순하고 과장된다. 군중은 부분들 사이의 섬세한 차이를 구별할 줄 모르고 사물을 뭉뚱그려 전체로 간단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군중에게 암시될 사상은 아주 단순한 형태를 띠거나 이미지로 표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군중에게 매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거의 이미지뿐이다. 이런 이유로 로마 황제들은 과시적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한 것이다.
결국 군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단순화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렬하게 암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암시된 이념과 이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한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위해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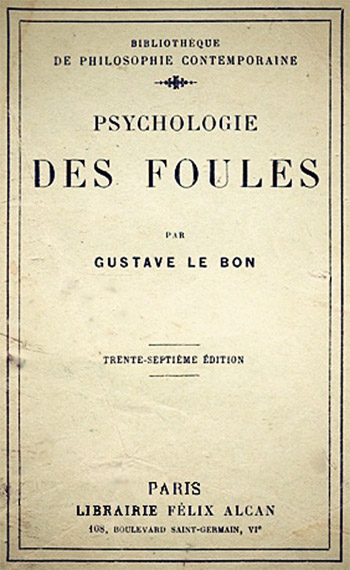
따라서 군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술을 아는 것이 곧 그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개성을 상실한 군중 속의 개인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군중은 반항적이면서도, 동시에 순종적인 것이다. 이때 확언, 반복, 전염 등을 통해 군중의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처럼 르봉은 군중의 특징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다분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만약 그의 생각이 그의 계급적 한계에 머무르고 말았다면, 그의 이론은 매우 조잡한 것이 되어 곧 잊혀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정적 시각을 넘어서서 군중의 특징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그는 군중을 다면적으로 바라보았다. 사회적 관습에 도전하고 이기적 충동에 휩쓸린다는 측면에서 군중은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헌신, 충성, 공평, 자기희생, 형평성 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도덕적’이다. 이런 다면성으로 인해 군중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이 결코 할 수 없는 숭고한 행위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 그는 바로 이러한 행위가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신조나 신념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도 무릅쓰게 하고 영광과 명예에 대한 열광주의로 고무되는 것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군중이다.… 그러한 영웅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어느 정도 무의식적이다. 그러나 역사를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영웅주의이다.”
르봉은 군중의 요소로 ‘공간적’ 결합보다 ‘심리적’ 결합을 강조했다. 이러한 통찰력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오늘날 SNS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촘촘히 연결된 대중은 ‘항시적’ 군중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명분만 주어지면 금세 광장에 수십만 명이 운집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오늘날 군중은 정치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 탄핵 표결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도 군중이다. 이를 계기로 군중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기저에 ‘상시적’ 동원 메커니즘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처럼 군중은 민주화의 진척으로 사라지는 듯하다가,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작동하지 못하자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군중은 더 이상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뭇 주도세력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평가는 기대와 우려로 엇갈린다.
이번 주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들이 ‘군중이냐 시민이냐’ 하는 문제는 논쟁적이다. 아마 양자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이들의 시민적 특징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만, 군중적 특징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다. 이러한 금기도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바이다. ‘군중심리학’은 다소 낡은 듯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생동감 넘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고전의 자격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