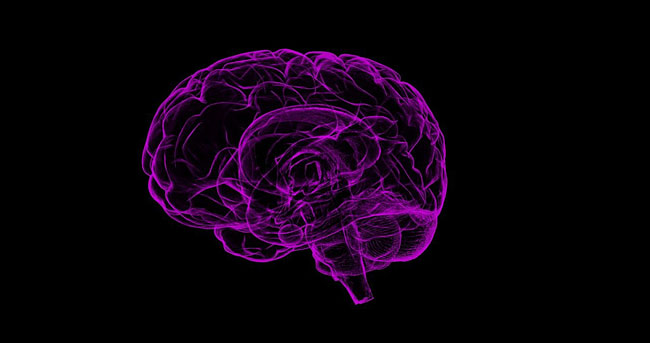
사람이 죽어도 뇌의 특정 세포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시카고일리노이대학(UIC) 연구팀은 사후 변화와 죽음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뇌수술에서 채취한 신선한 뇌조직 샘플로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후에도 뇌에 있는 특정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좀비 유전자’는 신경교세포(glial cell)라고 불리는 염증성 세포로, 연구진은 이 좀비세포가 사후 몇 시간뒤까지 팔처럼 긴 부속물을 만들어내며 활동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 연구를 이끈 UIC 의과대학 신경 및 재활전문의 제프리 롭 박사는 “신경교세포는 원래 산소 결핍이나 뇌졸중 같은 뇌손상을 치료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점에서 사망 후 신경교세포가 커지며 팽창하는 현상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롭 박사는 “좀비 유전자는 정신분열증이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장애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에게 중요하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심장이 작동을 멈추면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의 활동이 멈춘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가 인간의 뇌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해석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후 인간의 뇌 조직을 이용해 자폐증, 조현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잠재적인 치료법을 찾는 기존의 연구들은 사후 유전자 발현이나 세포 활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연구진은 이번에 분석한 유전자의 약 80%가 사망 후 24시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전자 발현 방식은 사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우스키핑 유전자는 어떤 세포에서든지 항상 구성적으로 발현하면서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유전자다.
반면 기억, 사고, 발작 등 인간의 뇌 활동에 복잡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뉴런 유전자 그룹은 사후 몇 시간 만에 급격히 퇴화했다. 인간 사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는 좀비 유전자는 뉴런 유전자가 퇴화됨과 동시에 활동이 증가했으며, 이런 변화 패턴은 사후 12시간에 정점을 찍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3일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