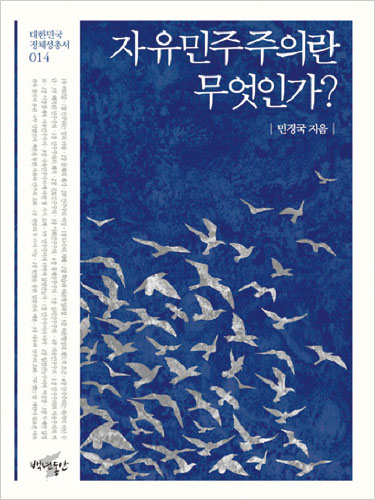
한때 정부·여당은 개헌을 제안하면서 헌법 조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다. 또한 초·중등 교과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려고 할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 다수결을 통한 입법은 무조건 옳을까.
이런 곤혹스러운 난제를 푸는 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있다. 바로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의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2015)이다. 저자는 사상사·경제사에 일가견이 있는 원로학자다. 그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따져본 다음, 그것이 도리어 자유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제한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 핵심은 다수의 지배다. 즉 다수결에 의해 지배자를 뽑고, 집행할 정책과 법을 정하거나 바꾸는 절차 또는 방법이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소수가 승복하는 이유는 다수가 현명하거나 전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다. 다만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권을 위임받은 다수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승복은 잠정적일 뿐이다.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명은 항상 다수가 정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수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소수의 견해가 공론의 장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상이한 목표와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적 영역과 행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다수의 지배는 늘 다수의 폭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다수의 의견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구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집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탁월한 정치제도다. 다만 그것은 다수결이라는 수단 또는 제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상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대충 같은 것으로 혼동한다. 자유를 정치적 자유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적 자유도 포함된다. 개인적 자유에는 경제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시민적 자유는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학문·생각·양심의 자유 등이다.
자유를 정치적 자유로 국한해 보면, 민주주의가 형성한 일체의 상황은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나치독일처럼 투표를 통해 국민이 폭정에 예속되기도 한다. 즉 국민이 정부를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적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도 체류국에서 상당한 개인적 자유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권위주의에서도 제한적 자유는 누릴 수 있다. 중국처럼 어느 정도 시장이 허용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 그는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권위주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유주의-전체주의와 민주주의-권위주의를 교차해 네 가지 이념 유형(자유민주주의, 권위적 자유주의, 민주적 전체주의, 권위적 전체주의)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적·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권위적 자유주의는 중국처럼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유보한 채 시장경제를 도입한 경우다. 따라서 권위적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민주적 전체주의는 나치즘이 대표적이다. 사회민주주의도 이 범주에 속한다. 권위적 전체주의는 과거 공산국가나 오늘날 북한이 대표적이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요즘 경제적 민주화 바람이 거세다. 그것은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풀되, 경제적 자유는 묶는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유가 도리어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즉 그것들은 서로 얽혀 발전해왔다. 이를 강제로 분리하면 효과가 크게 약화된다. 일부 유럽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번영을 달성했다. 그 번영에 기대어 사회민주주의를 시도했지만, 오늘날 그 폐해를 수정하느라고 분주하다.
자유는 우리에게 존엄과 번영을 안겨준다. 또한 민주주의는 더없이 탁월한 정치제도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지향점이 다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한 의사결정 수단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권력행사자가 독재자든 다수이든 그 행사를 제한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진다. 설사 다수의 결정이라도 절대적일 수 없다. 더구나 개인에게는 국가가 결코 간섭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사안들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법의 지배이고, 사법(private law)과 공법(public law)의 구분이다. 이처럼 법의 지배란 법의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 본래 법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행동 규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의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런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법은 정당한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늘날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가 횡행한다. 그런 무제한적 민주주의는 사회의 궁극적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모든 것을 다수결에 맡긴다. 이런 와중에 법은 특정한 국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고 만다. 특히 공법이 사적 영역을 제한 없이 침입하여 자생적 질서를 조직으로 바꾼다. 즉 사법 사회를 공법 사회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과잉 민주주의의 폐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또는 ‘절제된’ 민주주의가 절실한 노릇이다.
우리 헌법은 권력구조는 잘 규정해 놓고 있지만, 입법 제한 장치는 미흡하다. 민주주의 만능에 빠진 1987년 체제 탓이다. 그래서 국회의 다수가 정한 것은 무조건 법으로 인정된다. 이런 헌법은 입법 폭주를 통해 포퓰리즘을 부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헌법에 입법·조세·예산 등에 관한 권력을 제한하는 강력한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현 집권세력은 수시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내려고 한다. ‘자유’를 지운 민주주의는 곧바로 과잉 민주주의, 입법 만능주의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안 그래도 요즘 국회에서 입법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 무슨 말이 붙을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