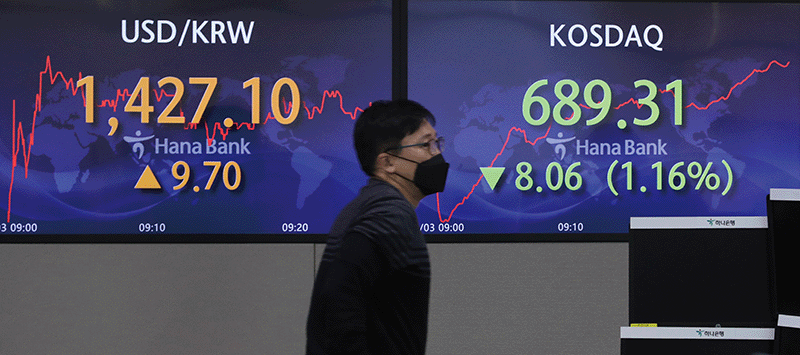
지난 10월 27일 국내 자금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연쇄 디폴트의 ‘불씨’로 주목받던 레고랜드 채무와 둔촌주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일단 위기를 넘겼다. 이날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레고랜드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갚겠다고 밝혔고, 사업비 7000억원을 시공사가 떠안을 위기에 처했던 둔촌주공 PF 관련 채권은 만기를 하루 남기고 차환(발행된 채권을 새 채권으로 상환)에 성공했다. 다만 단기채 금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부실채권이 넘치고 있어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로 연말로 예정되었던 소비촉진 행사가 취소 혹은 축소된 것도 ‘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금융위기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최근 만난 정부 경제정책 실무 담당자에게 “혹시 1997년처럼 IMF 외환위기가 한 번 더 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뛰고 있다”고 했다. 그냥 두면 터지는 부실 폭탄은 부동산 PF 부실과 늘어나는 부실채권이다.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10조원을 넘어선 상태로 이미 대기업 계열 건설사 부도 이야기가 돌고 있다.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PF로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금리까지 올랐다. 여기에 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비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는데 돈을 빌리기는커녕 기존 빚도 빨리 갚으라고 하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며 급증하고 있는 부실채권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폭탄이다. 영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최근 2년간 24% 늘어나 2800여개에 달한다. 올
1분기 증권사 부실채권 비율은 8.3%로 지난해 말 5.9%와 비교해 2.4%포인트 올라갔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50조원+α)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빨간불이다.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524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현재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중국 시장이 위축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결과다. 한국 경제를 지탱한 중국과 반도체 양쪽이 무너지는 모양이어서 위기감이 크다.
디폴트 폭탄은 일본에서 터진다?
디폴트는 전염병처럼 확산한다. 폭탄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여전하다. 최근 일본발 외환위기설이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는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시작됐다.
일본 외환위기설의 도화선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엔화 가치 하락이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엔화 가치는 150엔이 무너졌다. 지난해 말 대비 28% 상승한 상황이다. 일본의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 자본은 유출되는데 국채는 안 팔리게 된다. 심각해지면 일본이 일시적일지라도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일본은 무역적자가 심한 나라로, 결제는 달러로 해야 하기에 가면 갈수록 달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IMF 등이 보증을 서서 위기는 넘기게 되겠지만 돈을 받지 못한 국가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지금으로선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금리 차이가 커지는 것이 본질적 원인인데, 일본은 국채 규모가 너무 커서 자칫 금리를 올리면 엄청난 국채 상환 부담을 져야 한다. 올해 1분기 일본 국채 잔액은 1225조엔(약 1경1908조원)에 이른다. 그 결과 31년 만의 최고 물가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일본은행은 세계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CD) 발행이 늘어난 것이 여의도 금융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기준 CD 평균잔액은 31조3912억원으로 지난해 말(25조8181억원)과 비교하면 5조5731억원 늘어났다. CD는 은행이 양도 가능한 권리까지 부여해 발행한다.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고, 무기명이라 계좌추적이 어려워 뇌물 혹은 자금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리인상이 증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하경제의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이 늘면서 금융계에서는 만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마지막 대책은 국내외 지하자금을 끌어오는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조세 회피지역에 비자금을 많이 숨겨 놓은 나라로 지적돼 왔다. 2012년 7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당시 7790억달러를 해외에 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외 조세회피처를 추적해온 이대순 변호사는 “엄청난 자금이 해외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1970년대부터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 금융권 관계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국내 주식을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돼 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이 해외에 숨겨 놓은 돈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지하자금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과거 CD와 함께 비자금 조성의 투톱으로 알려졌던 무기명채권이다. 무기명채권은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다. 외환위기가 시장을 강타한 1998년 돈 가뭄에 시달리던 정부는 당시 무기명채권 3조7730억원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국가 부도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 달러를 만들어야 했기에 경제 수익에 면죄부를 주는 ‘경제 대사면’이라는 비판을 감수했었다.
‘무기명 내세우면 마이너스 채권도 팔린다’
사실 무기명채권은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었다. 비상상황에서 일단 위기를 넘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당시 민주당 최운열 금융안정태스크포스 단장과 일부 의원들은 무기명채권 발행을 주장했었다. 시중 유동자금을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에 쓰자는 것이 명분이었다. 당시 “금리를 제로 혹은 마이너스로 발행하면 정부의 채무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무기명’을 내세우면 마이너스 채권도 팔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무기명채권이 공론화하자, 1인당 매입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무기명채권이 인기가 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상속,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세금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 아파트를 팔아 무기명채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경제가 위기라는 시그널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