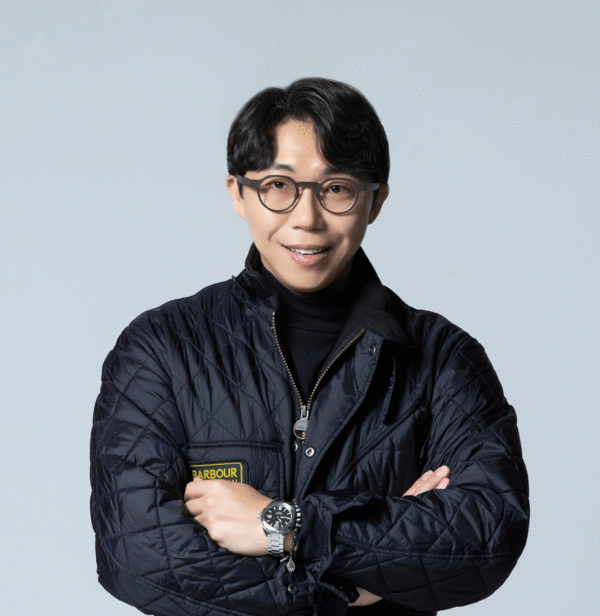
검찰의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3심제 사법체계에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항소가 의무는 아니지만,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판결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개 불복하며 쌍방 항소로 이어집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죠. 특히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낮아지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즉시 항소 혹은 상고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검찰 스스로 수사가 잘못됐거나 무리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스운 꼴이 되면서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권력 외압’ 혹은 ‘눈치 보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사 논리가 아닌, 살아 있는 정권을 의식한 ‘호의적’ 혹은 ‘선택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며 여야가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마땅한 ‘항소 자제’라며,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반발하는 검사들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검사징계법’ 개정을 통해 해임과 파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윗선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한 상황에서 항명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등이 징계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라면, 합당한 판결에 이르고자 항소와 상고로 공소 유지를 하는 건 사법적 권리를 넘어 직무상 의무일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국정조사로 짚어보는 것 역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선택적 정의’ 혹은 ‘지연된 정의’를 경계하기 위해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