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빙하 근처에 거대한 ‘수중커튼(해저커튼)’을 설치하자는 과학자들의 과감한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핀란드 라플란드대 북극센터의 교수이자 빙하학자인 존 무어(John Moore) 교수팀이 극지방의 얼음이 기록적인 속도로 사라지자 빙하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해저커튼은 빙하 해저에 부유벽을 건설해 따뜻한 해류인 난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무어 교수는 지난해 12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해저커튼 아이디어를 널리 전하고 있다.
무어 교수가 해저커튼 계획을 처음 제안한 것은 2018년이다. 남극에 해저 인공 장벽을 세워 난류가 남극 빙하에 도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이후 2020년 ‘토목섬유 물질을 이용해 만든 해저커튼을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해저커튼은 물에 뜨는 유연한 구조물로, 따뜻한 해수의 흐름을 막아 물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따뜻한 해수의 방향 바꿔 얼음 손실 막아
극지방 바다에서는 소금 농도가 더 진한 따뜻한 해수가 깊은 곳으로 흐르고 더 차가운 물은 위쪽에 있다. 이 난류가 빙하 밑 부분을 공략해 빙하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무어 교수의 해저커튼 설치 배경은 극지방 빙하 소실이 예상보다 가파른 상황이라는 데 있다.
지난 1월 17일 미 항공우주국(NASA)과 제트추진연구소(JPL) 공동연구진은 북극 그린란드 빙하 가장자리가 표시된 37년간(1985~2022년)의 위성사진 23만6000여장을 분석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빙하가 20% 더 사라졌다는 결과를 네이처에 공개했다. 그린란드에선 2003년 이후 연간 약 2600억t에 달하는 빙하가 녹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3000만t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또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에 따르면 2020년 10월에 북극을 덮고 있던 얼음 면적은 528만㎢로 역대 10월 관측값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극 빙하 면적은 2016년 10월 640만㎢, 2018년 10월에는 606만㎢를 기록했다. 2020년의 면적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작았던 2019년 10월의 566만㎢보다도 작은 수치다.
남극대륙의 빙하 역시 소실 문제가 심각하다. 남극대륙은 수천 미터 두께의 빙하로 덮여 있다. 그중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남극이다. 서남극 대륙에는 해발고도가 해수면보다 낮아 빙하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과 만나 녹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이 다수 있다. 특히 ‘지구 종말의 빙하’라는 별명을 가진 스웨이츠 빙하가 대표적이다. 이 빙하가 녹을 경우 지구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의 초대형 빙하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9만2000㎢에 달한다. 한반도(22만2000㎢) 크기와 비슷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스웨이츠 빙하가 붕괴돼 전부 녹을 경우 해수면이 65㎝쯤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주변 빙하까지 가세한다면 해수면이 3m까지 올라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이 바다에 잠겨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서남극 빙상이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은 5.6m 높아질 거라고 경고한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남극연구소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인 1.5도 이내로 억제한다고 해도 이번 세기에 일어날 해수면 상승에 그린란드와 남극대륙 빙하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어두운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어 교수팀은 고정된 해저커튼을 사용해 해빙을 늦추는 방법을 찾아냈다. 빙하가 난류와 만나는 끝단 수심 600m에 100m 높이의 해저커튼을 80㎞ 길이로 부유벽을 세워 난류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커튼이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것처럼 난류를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럴 경우 얼음이 녹는 속도가 줄어들어 빙붕이 두꺼워지고 바다까지 길게 이어질 시간을 벌어준다. 만약 빙붕이 길게 이어져 해수커튼 위까지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진다면 빙하는 다시 질량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무어 교수의 설명이다.
빙붕은 얼음이 바다를 만나 평평하게 얼어붙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일 년 내내 300~900m 두께의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상의 연장선으로 내륙 빙하를 유지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 빙붕이 없다면 내륙 빙하가 바다로 더 빨리 흘러 해수면 상승도 더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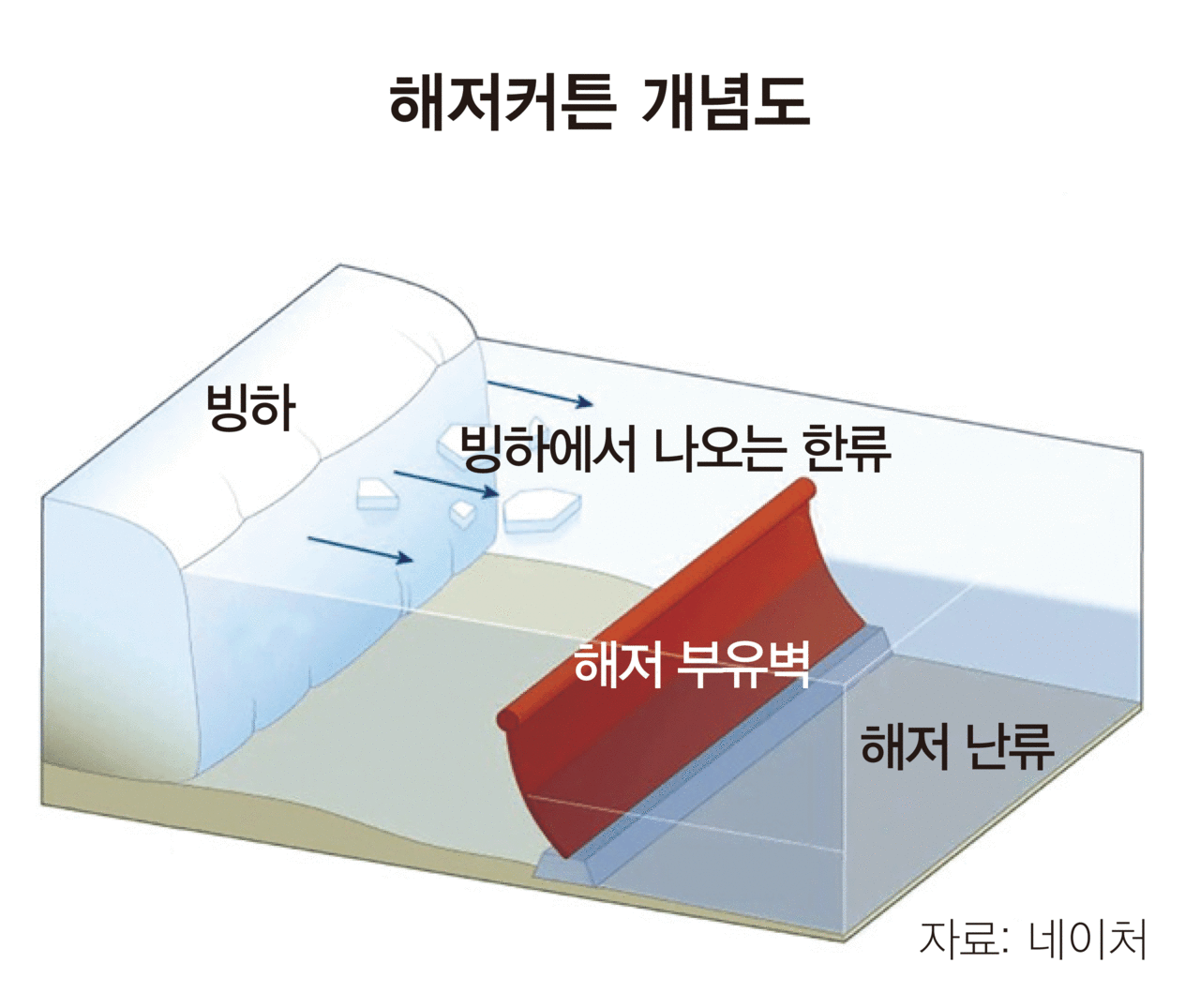
해양 생태계 영향, 비용 문제 극복해야
연구팀은 모의실험을 통해 해저커튼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남극 스웨이츠 빙하에 해저커튼을 설치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해저 부유벽이 빙붕에 도달하는 난류를 약 70%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바다 밑에 건설될 커튼은 얼음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하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무어 교수는 말한다.
무어 교수는 처음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미끄러운 플라스틱이 커튼 재료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플라스틱을 모든 곳에 사용하기엔 좋은 재료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는 플라스틱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대마, 사이잘삼 등의 천연섬유가 검증 대상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무어 교수가 제안한 해저커튼 기술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험할 계획이다. 물론 해저커튼 설치가 빙하를 보존하기 위한 완전한 예방책은 아니다. 난류를 막는다고 해도 결국 따뜻한 대기가 빙하를 녹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지구촌이 온실가스 수치를 낮추는 동안 해저커튼이 빙하 손실을 막을 고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이 대학 기후복구센터의 숀 피츠제럴드 센터장의 설명이다.
반면 해저커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해저커튼으로 차단한 난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또 폭풍우가 치는 남극 바다에서의 작업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다. 네이처에 따르면 높이 100m에 80㎞ 길이를 만들려면 설치비용만 400억~800억달러(약 53조~107조원)에 연간 유지보수 비용 10억~2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해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모든 해안가를 차단하는 막대한 작업 비용(수조 달러)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다며 경쟁력이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피츠제럴드 센터장은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기술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나 불신은 그 이상으로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