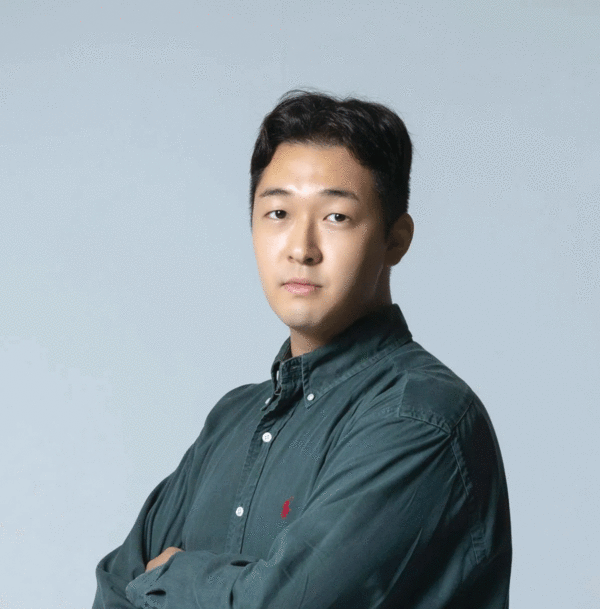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작동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은 소수의 납득을 전제로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소수는 집회와 시위라는 방법으로 사회 전체에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 당위성이야 문제삼을 수 없겠지만, 설득력은 평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명분과 요구 등을 놓고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가 수용해야 할 요구인지 여론이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 언론입니다.
지난해 연말 동덕여대에서도 학교 측의 일방적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간조선 기자 세 명이 연속보도했는데, 시위대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언론관이 저희와는 좀 달랐던 모양이죠. 취재해 보니 학교 측은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위대는 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래커칠’을 했다지만 그전부터 파괴 행위와 캠퍼스 점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일삼았고, 음대 졸업연주회를 가로막고 교수가 시위 지지 선언문을 관객 앞에서 읽는 조건으로 공연을 허락했습니다.
시위대는 저희를 고소하면서도 진실을 밝히는 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회의록에서 수업 거부가 투표도 없이 강제적으로 하달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도하자 해당 문서를 지우더군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진보매체에는 ‘주간조선은 우리에게 전화한 적도 없는데 반론권을 보장했다고 거짓말한다’고 했다네요. 해당 매체 기자들께서 묻기에 증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여론이 싸늘해졌지만 시위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후덕한 관용을 입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대가 입힌 물리적 피해액만 40억~5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주간조선이 단독보도한 바 있죠.
맨 앞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주제넘은 설법을 했습니다. 독자들께 송구스럽지만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영향은 주지 않았겠지만, 저희는 9개월간의 조사 끝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1년이 지나갑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들마저 포용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