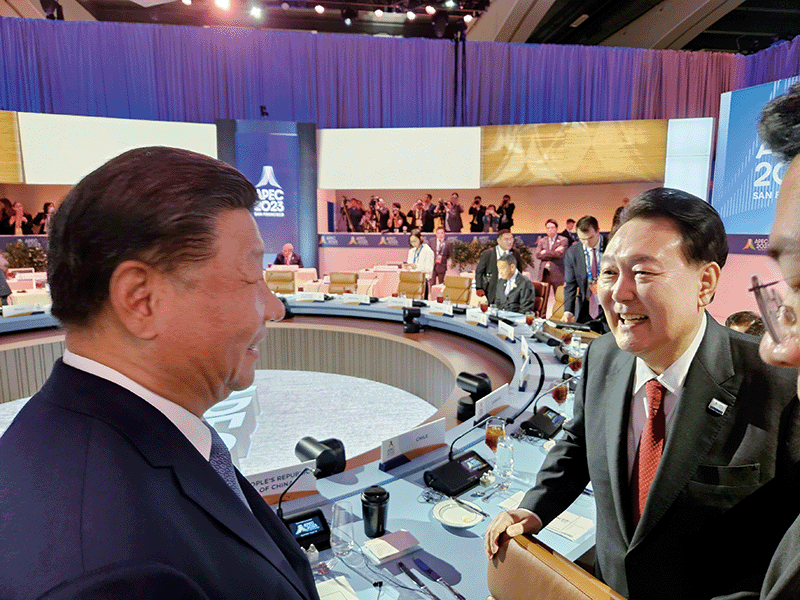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로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다. 이 와중에 중국 정부가 오는 11월 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15일 비자(사증) 면제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에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전격 추가한 것이다. 중국의 비자면제 조치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후 32년 만으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에는 모처럼 중국발(發) 훈풍이 불고 있다.
사실 일방적 비자면제라고는 하지만 외교적 사안이고, 양국 교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다. 이에 사전에 상대국에 알려주는 것이 외교 관례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중국 외교부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할 때까지 주중 한국대사관조차 해당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보면 이번 비자면제 조치는 중국 수뇌부 차원의 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비자면제, 북·러 밀착 견제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전격 단행한 이유가 북한의 ‘친러’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과거 대만을 해방하려는 순간,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키고 소련 스탈린이 막후에서 이끈 6·25전쟁에 연루돼 막대한 전비와 인력 손실을 입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으로 인해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깨지는 상황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심화하면서 중국의 통제를 벗어난 행보를 보이자, 한국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염려해 한국과의 관계를 일단 돈독히 해야겠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역시 한·중 관계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이나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체계 관련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다. 또 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으로 실전경험을 쌓고 드론 등 현대전 전술을 습득할 수 있어 한국에 직접적 군사적 위협이 된다. 또한 북한은 외교적으로 ‘한·미 대(對) 북한’의 대결 구도를 ‘한·미 대 북·러’ 구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은 ‘북·러 밀착’이 향후 ‘북·중·러 밀착’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오는 11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중 양국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33년 전인 1991년, 중국이 APEC에 가입할 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이듬해인 1992년 8월 한·중 수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전례가 있다.
중국 APEC 가입 난제 해결한 한국
1991년 APEC 가입 당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인해 결코 대만·홍콩과 동등하게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중국은 주권국가 신분으로 가입해야 하고 대만과 홍콩은 지역경제체로서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홍콩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대만은 중국의 입장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대만·홍콩이 APEC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외교적 난제였다. 당시 APEC 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 Meeting) 의장국인 한국의 이시영 전 주UN대사(전 외무부 차관)가 이 같은 임무를 떠맡게 되자, 이 전 대사와 친한 외교관들이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이 전 대사를 위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시영 전 대사는 중국·대만·홍콩을 수없이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벌이며 거중조정을 통해 ‘3개의 중국’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1991년 8월 26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SOM 8차 회의에서 교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함으로써 중국·대만(Chinese Taipei 명칭)·홍콩(Hong Kong, China 명칭)의 APEC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1989년 천안문(天安門) 유혈사태의 여파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APEC 가입은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첸치천(錢其琛)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 리란칭(李嵐清) 대외경제무역부장(전 부총리)이 이끄는 중국 정부 대표단이 방한했다. 당시 이들 방한단을 접견한 노태우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더 이상 단절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조성해 놓은 선린우호 관계를 우리 대(代)에 와서 단절시킨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양국은 관계 수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한·중 수교의 뜻도 넌지시 전달했다. “노 대통령의 말씀을 귀국하는 대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첸치천 외교부장이 답한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1992년 2월 이시영 전 대사를 접견한 첸치천 외교부장은 “당신이 중국을 APEC에 가입시킨 것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자신의 회고록 ‘외교십기(外交十記)’에도 “한국이 서울 회의 전에 중국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썼다. 같은 회고록에서 첸 부장은 “노태우 대통령은 비록 군인 출신이지만 비교적 온화했으며 중국과의 수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첸치천 외교부장은 1992년 한·중 수교 때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과 함께 수교협정서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다.
이처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양국관계 발전과정에서 양국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거의 빠짐없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의견을 나눠왔다. 11월 8일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면제 조치가 실시되고 일주일 뒤인 오는 11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역시 이 같은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아직까지 별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때는 양국 정상이 짧은 환담을 나누는 수준에 그쳤다. 조속한 한·중 정상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페루 리마 APEC 이듬해인 오는 2025년에는 한국이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한·중 양국 간 소통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APEC을 통해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